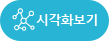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8700452 |
|---|---|
| 한자 | 密陽 朴陽春 閭表碑閣 |
| 분야 | 역사/전통 시대,문화유산/유형 유산 |
| 유형 | 유적/건물 |
| 지역 |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송포로 194[후사포리 262-1] |
| 시대 | 조선/조선 전기,근대/일제 강점기 |
| 집필자 | 김영록 |
| 건립 시기/일시 | 1912년 |
|---|---|
| 문화재 지정 일시 | 1993년 1월 8일 |
| 특기 사항 시기/일시 | 2021년 6월 29일 - 밀양 박양춘 여표비각 「문화재보호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번호 삭제 |
| 현 소재지 | 밀양 박양춘 여표비각 -
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송포로 194[후사포리 262-1] |
| 성격 | 정려각 |
| 관련 인물 | 박양춘|김도화 |
| 문화재 지정 번호 |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95호 |
[정의]
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에 있는 조선시대 효자 박양춘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일제강점기 비각.
[개설]
밀양 박양춘 여표비각(密陽朴陽春閭表碑閣)은 모헌 박양춘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정려각이다.
박양춘은 효행으로 호조참의에 제수된 박항(朴恒)의 아들이었다. 박양춘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할머니와 어머니의 상을 한꺼번에 당하였는데, 피난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빈소를 마련하였다. 왜장(倭將) 이시다 미츠나리[石田三成]가 박양춘의 모습에 감동하여 ‘출천지효(天出之孝)[하늘에서 내린 효자]’라는 글을 써 마을 입구에 정표하여 뒤따르는 왜병의 침략을 막아 주었다고 한다. 이후 마을에서 교훈으로 삼고자 정려각을 세웠다. 사후에 박양춘의 효성과 청렴함이 알려져 박항은 이조참의에 증직되었고, 정조 때 『삼강록(三綱錄)』에 실렸다.
[건립 경위]
정려각이 퇴락되자 1912년 손익현, 조세모, 이후성, 이병희 등의 유림들이 박양춘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박양춘의 출생지인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에 여표비를 세우고 비각을 건립하였다.
[위치]
밀양 박양춘 여표비각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 262-1 일원에 있다.
[형태]
부좌는 거북이 형상을 한 귀부형(龜趺形)이며, 개석은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이수형(螭首形)이다. 비각은 정면 3칸, 측면 1칸이며, 공포 유형은 익공이 세 개인 삼익공(三翼工)이다.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의 구조로 되어 있다. 비각의 둘레에 담장을 두르고 정면에 출입문을 두었다.
[금석문]
이후성, 이병희 등이 김도화에게 부탁하여 글을 지었으며, 글씨는 안종석이 새겼다. 비문에는 박양춘의 행적과 정려각을 세우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. 내용은 박양춘의 지극한 효성을 드러내는 일화를 전하고 있는데, ‘1582년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장례를 지낸 뒤 죽곡리 선영 아래 여막을 짓고 낮에는 묘소를 지키고,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. 어느 날 삼랑진읍 임천리 광탄에 이르자 폭우가 쏟아서 불어난 물로 건널 수가 없자,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니 강물이 갈라서 옷도 젖지 않고 건널 수 있었다.’라는 내용이다. 김도화의 문집인 『척암집(拓菴集)』에 ‘모헌박선생여표유허비명(慕軒朴先生閭表遺墟碑銘)’이 수록되어 있어 비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[현황]
밀양 박양춘 여표비각은 1993년 1월 8일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95호로 지정되었다. 2021년 6월 29일 「문화재보호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지정 번호가 삭제되었다.
[의의와 평가]
밀양 박양춘 여표비각은 모헌 박양춘의 행적을 알 수 있으며, 경상남도 밀양 지역 현창 사업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.
- 『척암집(拓菴集)』
- 밀양시청(https://www.miryang.go.kr)